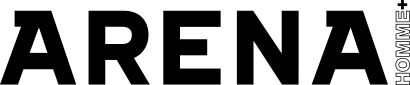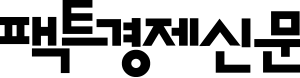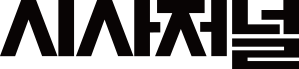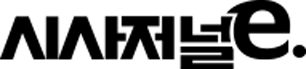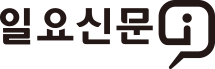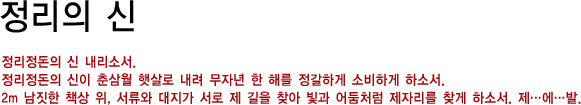
 기도의 힘을 빌려서라도 쑥대밭인 책상에 청결한 기운을 불어넣고 싶다. 모든 물건이 스스로 자리를 찾고, 모든 서류가 일련번호에 맞춰 정렬하며, 정체 모를 영수증들은 계산기 앞에 도열하고, 필통에는 일회용 젓가락이 아닌 펜만이 도도하게 자리한, 그런 말끔한 책상을 갖고 싶다.
기도의 힘을 빌려서라도 쑥대밭인 책상에 청결한 기운을 불어넣고 싶다. 모든 물건이 스스로 자리를 찾고, 모든 서류가 일련번호에 맞춰 정렬하며, 정체 모를 영수증들은 계산기 앞에 도열하고, 필통에는 일회용 젓가락이 아닌 펜만이 도도하게 자리한, 그런 말끔한 책상을 갖고 싶다.
란스미어 코트에 멀버리 가방을 들고 마놀로 블라닉 스틸레토 힐을 신고 앉아 있으면 뭐 하나. 일회용 종이컵이 탑처럼 쌓이고 온갖 서류와 보도자료가 구겨진 얼굴로 대면하고, 한 달치 신문은 뒤엉키다 못해 짓이겨진 책상을 앞에 두고 말이다. 사실 나에게 ‘정리’란 마감 후의 밀린 숙제로, ‘정돈’이란 승진의 꿈-비서가 생길 수도 있으니-을 꾸게 하는 유일한 요소, 다름 아니다.
어쩌면 나에겐 아직도 뒤통수에 매달린 어머니의 잔소리가 필요한지도 모른다. 치워라, 버려라, 넣어라, 닦아라…. 말꼬리를 채서 창밖으로 내던지고 싶을 정도로 귀찮고 집요한 잔소리, 그 범위가 미치지 않는 사무실 책상은 그래서 자주적으로 청결할 수 없는지도 모른다. 퍽이나 자주적이길 포기한 나의 청결 지수는 때때로 나를 궁지로 몰아넣는다. 철 지난 서류를 되돌려 다시 점검해야 할 때도, 월 단위 매출과 지출의 손익을 계산할 때도, 브랜드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30초 안에 찾아야 할 때도, 지층처럼 켜켜이 쌓인 종이 더미들 속에서 길을 잃곤 한다. 가끔은 밤새 교열 봐둔 기자들의 원고 뭉치를 찾느라 비지땀을 흘리기도 한다(이건 기자들이 몰라야 할 텐데…)! 하지만 가장 곤혹스러운 것은 부서원들에게 청결을 강요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것이야말로 내 눈에 든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든 티끌을 탓하는 꼴 아닌가.
뭐 생긴 대로 신경 안 쓰고 사는 방법이 있긴 하겠다. 하지만 그러기엔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나의 우뚝한 양심이 뒷덜미를 잡고 놓지 않는다. 게다가 <아레나>는 독자들에게 환경문제를 자각하는 블랙칼라 워커가 되라고 수차례 권고하지 않았던가. <뉴욕타임스>는 개인의 몰지각한 쓰레기 처리 문제를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일회용 제품을 남용하고(나다. 하루에 커피를 6잔 이상, 그것도 일회용 종이컵에 마신다), 음식물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또 나다, 주전부리를 매번 남기고 그걸 티슈에 둘둘 말아두었다가 거들떠보기 싫으면 휴지통에 던져버린다), 분리수거를 안 하는(또 나다, 서류 더미에 깔려 죽을 것 같은 날엔 비닐 파일이든, 종이 파일이든, 플라스틱이든 할 것 없이 한꺼번에 쓸어 내다버린다) 개개인이 환경오염의 원인 제공자라는 것이다. 소시민의 실천보다 국가 행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온 나였지만 사무실에서의 무자비한 쓰레기 처리가 전부 무심한 정리정돈 습성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만은 깊이 반성하는 중. 수많은 환경단체에서 제시한 생활 속 환경운동 항목에서 그나마 자신 있게 동그라미를 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고기 소비를 줄이자’라는 조항밖에 없던(244kg의 소 한 마리가 배출하는 오염 물질은 14.6리터로 토요타 자동차 10대의 배기가스 배출량과 같단다) 나로서는 말이다.
그리하여 2주년 창간 기념호를 맞아 의미 있는-특히 나에게-약속을 하나 하기로 했다. 독자들에게는 지면을 건 약속이고 기자들과는 양심을 건 협약 정도가 되겠다. 그게 바로 106페이지에 소개된 <아레나> 편집부 머그잔 쇼핑기다. 마감 중 나는 달랑 1만원짜리 한 장 던져주고 기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다. 그리곤 머그잔을 사오라고 강요했다. 폭군 기질을 발동한 이 배당에 참하고 선한 기자들이 기꺼이(라고 믿고 싶다) 동참하였고 그 결과물은 ‘Save the Office’라는 제목을 달고 이달 <아레나>에 자리했다. 물론 ‘철학이 있는 쇼핑’을 주창해온 <아레나> 기자들은 웃돈을 얹어 머그잔을 사들고 사무실로 귀환했다.
성범수 기자는 카이 프랑크가 디자인했다는 짙은 청색 머그잔을, 이민정 기자는 손에 쏙 들어오는 색동 컬러의 엽찻잔을, 김민정 기자는 그 유명한 ‘지로돈토’를, 이기원 기자는 손잡이가 안으로 움푹 파인 새초롬한 흰색 찻잔을, 박만현 기자는 종이컵을 패러디한 하늘색 사기잔을 책상 위에 풀어놓았다. 물론 아직 일회용 컵과의 혼용이 사라진 건 아니다. 누군가는 머그컵을 일회용 종이컵 받침대로 Tm기도 하고, 심지어 나는 머그잔의 포장지를 아직 풀지도 않았으니까.
하지만 나는 안다.
종이컵 퇴치 운동을 시작으로 내 책상 위의 쓰레기도 제 갈 길을 찾을 것이고, 나는 녹색 완장을 찬 선도부장이 되어 당당하게 고함을 내지르게 될 것이다. 과연? 하고 반문하는 기자들과 독자들에게 약속한다. 아니, 약속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사는 내내 신념을 바탕으로 잡지를 만들면서 그 신념을 실천하지 않았던, 그리고 과소비가 아닌 고소비(물건을 소유함에 있어서의 철학, 지식을 바탕으로 한 소비)를 주장했던 나를 스스로 부끄럽게 여길 테니.
이 마감이 끝나면 사무실에 놀러 오는 지인들에게 종이컵 대신 흰 사기잔을 건넬 것이다(나는 커플 머그잔을 샀다).
확인하고 싶다면 나에게 오라.
**두 돌을 맞이한 <아레나> 3월호를 정리하며, 거창한 특집 기사와 수려한 화보가 번성한 수백 페이지 기사를 뒤로하고 머그잔 쇼핑기라는 한 페이지짜리 기사를 여러분 앞에 제일 먼저 진상하는 것은 이 한 페이지가 <아레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내가 이 물건을 왜 사야 하는가, 이 물건에는 어떤 정신이 깃들었는가, 이 물건의 철학과 내 생활의 원칙이 일치하는가, 나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을 함께 숙고하자는 <아레나>의 정신을 함축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물건을 사는(賣) 것은 삶을 사는(生) 것이다.
<아레나옴므플러스>의 모든 기사의 사진과 텍스트는 상업적인 용도로 일부 혹은 전체를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링크를 걸거나 SNS 퍼가기 버튼으로 공유해주세요.
KEYWORD(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