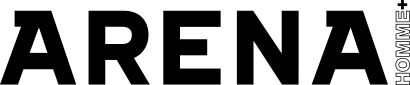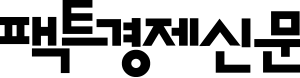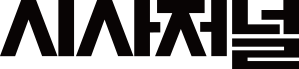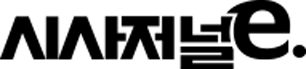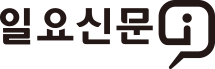.jpg)
+ 장진택(<카미디어> 기자) 쟁쟁한 경쟁자들이 참 많다. ‘저렴한’ 닛산 GT-R부터 아우디 R8, BMW M6, 포르쉐 911, 재규어 XKR,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 벤틀리 콘티넨탈까지, 멋지고 묵직하게 질주하는 머신들이 꽤 많다. 이 사이에서 SL 63 AMG가 갖춘 무기는 쿠페와 컨버터블을 버튼 하나로 오갈 수 있는 ‘하드톱 컨버터블’이라는 것과 커다란 AMG 엔진이 웅장한 배기음을 ‘으르렁’거린다는 것, 그리고 삼각별 마크가 가운데 박혀 있다는 거다. 물론, 모두에게 먹힐 수 있는 무기는 아니다. 특히 ‘하드톱 컨버터블’이라는 메뉴는 호불호가 심하게 나뉘고 있다. ★★★☆
+ 임유신(<톱기어> 기자) 하드톱을 달고 있는 동급의 로드스터는 흔치 않다. 한 대로 쿠페와 컨버터블 두 대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다. 소형 로드스터의 장난감 같은 경박함이나 덩치만 큰 대형 컨버터블이나 쿠페의 우악스러움을 배제한 적절한 절충이 돋보인다. 요즘은 동급 차들도 대부분 ‘에브리데이 스포츠카’를 표방한다. 그중에서도 SL은 ‘에브리데이’ 쪽으로 살짝 더 기울어져 있다. ★★★☆
+ 김종훈(<아레나> 에디터) 메르세데스-벤츠의 AMG 라인은 독보적이다. 그동안 쌓아온 명성도 드높다. 일단 동급 타 모델과 어깨를 견줄 때 무게가 실린다. 그러면서 하드톱 컨버터블이다. 희소성도 있다. 운전하기도 수월하다. SLS AMG 로드스터처럼 흉포하지 않다. 데일리카의 영역도 넘본다. 아, AMG의 엔진음을 매일 듣는다니!
스톱-스타트 기능이 그 징표다. 5등급 연비 63 AMG에게는 애교로 보이긴 하지만. 가격은 애교 수준이 아니다. ★★★★
.jpg)
+ 장진택(<카미디어> 기자) 성능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다. 시승 전날 폭설이 내려서 조금만 밟으면 엉덩이가 움찔하면서 겁을 줬다. 주행안정장치 같은 게 달려 있지만 그건 뽀송뽀송한 아스팔트에서나 통한다. 눈 위에서는 소심해야 한다. 자그마치 537마력에 토크가 81.6kg·m이다. 게다가 벤츠 하고도 AMG다. 눈길에서까지 겨뤄볼 스펙은 아니다. 사실 처음부터 주행 성능을 평가할 생각은 없었다. 몇 번 꾹꾹 밟아보고 ‘끝내준다’라고 쓰려고 했다. 마침 눈이 와서 좋은 핑계거리가 생겨버렸다. ‘으르렁’거리는 AMG 배기음에 만족하며 1박 2일 시승을 마쳤다. ★★★
+ 임유신(<톱기어> 기자) 537마력 5.5리터 바이터보 V8 엔진은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2000rpm부터 쏟아져 나오는 81.6kg·m의 최대토크가 밀어붙이는 가속력은 멀미를 불러일으킬 정도. 밟는 대로 나가는 것으로 모자라, 탄환이 발사되는 듯 엄청난 폭발력이다. 이러한 괴력을 안정적으로 통제하는 덕에 스릴과 짜릿함은 극한이지만 불안한 마음은 들지 않는다. ★★★★☆
+ 김종훈(<아레나> 에디터) SL 63 AMG의 시동을 걸고 가속페달을 밟는 일련의 동작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철컥, 장전한다. 가늠좌를 바라보고 심호흡한다. 숨을 멈춘다.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검지를 당긴다. 격발. 반동과 함께 탄환이 발사된다. 반동과 함께 SL 63 AMG가 튀어나간다. 둘 다 성능은 문제될 게 없다. 다만 총을 쏘는, 운전하는 사람이 주저할 뿐이다. 5.5리터 엔진이 뿜어내는 힘은 마냥 즐기기에 버겁다. 비록 진보한 기술이 안정적으로 차체를 붙잡아준다고 해도. ★★★★☆
.jpg)
+ 장진택(<카미디어> 기자) 일단 재료가 좋다. 진짜 가죽과 진짜 스티치, 진짜 알루미늄이다. 진짜 나무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짜 나무라도 이 정도면 잘 속인 거다. 아무튼 재료가 좋아서 일단 먹고 들어간다. 꾸미지 않았는데도 멋지다. 실내에는 지금까지 벤츠가 개발한 모든 첨단 장치들이 들어 있다고 보면 된다. 코너 돌 때, 쏠리는 허리 부위가 불룩해지면서 든든하게 받쳐주고, 지붕을 열고 달려도 뒷목은 뜨끈하다. 목 뒤에서 히터가 나오기 때문이다. 뱅앤올룹슨 스피커도 달려 있다. 투명한 지붕은 버튼을 누르면 검게 돌변하기도 한다. 이 신기한 지붕은 5백40만1천원짜리 선택 품목이다. ★★★★
+ 임유신(<톱기어> 기자) 여타 벤츠와 통일감 있는 레이아웃이라 신선한 맛은 떨어지지만 화려하기 그지없다. 새빨간 가죽 시트를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세련되고 감성적인 구성이다. 뚜껑이 열리는 차일수록 열었을 때 보이는 모습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듯하다. 네모난 시프트레버나 아래위가 살짝 눌린 스티어링 휠, 슈퍼 히어로의 갑옷처럼 생긴 시트 등 AMG 고유의 아이템들은 내재된 역동성에 대한 갈망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
+ 김종훈(<아레나> 에디터) 화려하다. 2억원이 넘는 차니까. 하지만 구석구석 장인의 공예품을 박아 넣진 않았다. 고상하다기보다 세련됐다고 할까. 스포티하면서도 가볍진 않다. 메르세데스-벤츠의 다른 차와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좀 더 힘을 줬다. 두 가지 색과 재질이 인테리어의 핵심이다. 검은색과 붉은색은 꽤 잘 어울리는 조합이다. 강렬하면서 도시적이다. 시나브로 차의 성격도 담는다. 사각 시프트레버는 호불호가 갈릴 게다. 고급스럽지만, 아담하다. 폭발적인 힘을 조절하는 상징으론 겸손하다. ★★★★
.jpg)
+ 장진택(<카미디어> 기자) 디자인 때문에 이 차를 사지 않을 사람은 없을 거다. 디자인에 반해서 이 차를 살 사람도 없을 것 같다. 그냥 ‘잘빠진 벤츠’다. 구석구석 벤츠답게 잘 다듬었을 뿐, 특별히 칭송할 곳도, 폄하할 곳도 없다. 다만 2억원이 넘는 호화 벤츠라는 느낌은 좀 약하다. E클래스 쿠페나 SLK와 비슷하다. 이게 곧 장점이자 단점이다. 티 내지 않으려는 이들에겐 아주 뿌듯한 디자인이지만, 티 좀 내고 싶은 사람들에겐 다소 심심할 수 있겠다. 참고로 비싼 차 티를 많이 내고 싶으면 몇천만원 비싼 SLS AMG가 있으니 참고할 것. 이건 페라리 부럽지 않은 슈퍼카로 보인다. ★★★
+ 임유신(<톱기어> 기자) ‘스타일로 말한다’가 딱 들어맞는다. 이 차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어도, 긴 보닛과 짧은 데크가 이뤄내는 비율을 보면 클래식한 전통이 스민 스포츠카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 수 있다. 늘씬하고 납작하게 바닥에 착 달라붙는 자세 하나는 끝내준다. 하지만 뭉툭한 프런트는 어색하다. 가운데로 뾰족하게 모이는 테일램프는 SL의 전통을 이어받았지만 프런트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쐐기형 프런트와 트윈서클 헤드램프를 달고 있던 시절이 디자인 면에서는 SL의 절정기였다. ★★★☆
+ 김종훈(<아레나> 에디터) 메르세데스-벤츠는 여성스러웠다. 새로 바뀐 디자인 콘셉트 이전엔 그랬다.
바뀌고 나선 남성성을 담뿍 담았다. CLS도, ML도 선이 굵어졌다. 우아함 대신 압도적인 힘을 과시한다. 전통의 벤츠에서 회춘하고픈 의도이리라. SL 63 AMG도 그 길에 동참한다. 일필휘지(一筆揮之). 망설임 없이 강직한 직선을 그어 나갔다. 단단한 기계 구조물을 대하는 기분이다. 보닛의 에어덕트가 기계 동물의 발톱처럼 매섭다. 해서 운전석에 앉으면 차보단 육중한 기계를 조종하는 느낌이다. 두근거린다. ★★★★
.jpg)
+ 장진택(<카미디어> 기자) 사실 이 정도 스펙의 차라면 굳이 승차감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자그마치 537마력에 토크가 81.6kg·m, 시속 0-100km 도달 시간은 4.3초다. 웬만한 슈퍼카를 잡는 성능이다. 하지만 SL 63 AMG는 평화로운 승차감까지 챙겼다. 역시 벤츠다. ‘C(Comfort)’ 모드에 놓고 슬슬 달리면 로맨틱한 드라이브가 가능하다. 람보르기니에선 이런 게 불가능하다. 딱딱한 지붕을 열고 닫는 하드톱 컨버터블인데, 이게 참 견고해서 덜렁거리지 않는다. 다른 회사 하드톱 컨버터블은 ‘울퉁불퉁’거릴 때마다 오래된 버스 창틀처럼 ‘덜거덕’거리기도 한다. ★★★★
+ 임유신(<톱기어) 기자) 하체는 탄탄하지만 타고 다니기는 편하다. 고성능과 승차감을 적절히 융화시킨 ‘에브리데이 스포츠카’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C와 S(Sport), S+ 모드 간 성격 차이가 좀 큰 편이라 때와 장소에 따라 잠잠히 있을 때와 나설 때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다. 회전대, 속도, 기어 변속 등에 따라 음색을 달리하는 사운드는 강렬하고 자극적이다. 승차감이나 사운드 등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경계선 바로 앞까지 도달해 있다. 그 선을 넘어가는 도발은 굳이 하지 않았다. ★★★☆
+ 김종훈(<아레나> 에디터) 각 주행 모드의 성격이 분명하다. 하여 승차감도 달라진다. C 모드라면 서스펜션이 세단보다 다소 단단한 정도다. 세단처럼 일반적인 주행에 알맞다(폼 나는 세단처럼 끌고 다녀도 된다는 얘기다). 대신 S+ 모드는 노면 상태를 즉각적으로 전달한다. 그럼에도 여진은 없다. 주장은 강하지만 뒤끝이 없달까. 인상적인 건 운전 자세다. 레그룸이 넓다. 허리를 세우고 다리를 뻗을 수 있다. 놀이동산 ‘후룸라이드’를 타는 기분이다. 확 트인 시야와 함께 운전에 흥을 돋운다. ★★★★☆
<아레나옴므플러스>의 모든 기사의 사진과 텍스트는 상업적인 용도로 일부 혹은 전체를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링크를 걸거나 SNS 퍼가기 버튼으로 공유해주세요.
KEYWORD